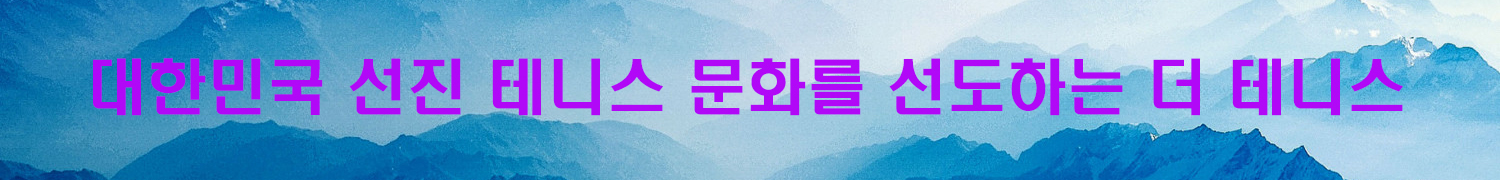부산 기장 실내체육관. 데이비스컵 예선 1라운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은 선수들의 땀방울만큼이나 심판들의 존재감이 선명했던 경기였다.
최근 그랜드슬램과 ATP·WTA 주요 대회에서는 전자 심판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대회들은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 전자 판독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이제는 “아웃”을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 대신, 미리 녹음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장면도 흔하다.
하지만 테니스의 묘미는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
선수와 심판 사이의 미묘한 긴장, 결정적 순간에 터져 나오는 챌린지 요청, 그리고 전광판에 떠오르는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숨 멎는 몇 초. 그 장면 자체가 또 하나의 승부다.
이번 데이비스컵에서 심판진은 그 긴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현장에서 본 기자가 지켜 본 선수들의 챌린지 요청은 총 8차례. 이 중 단 1건만 판정이 번복됐고, 나머지 7건은 모두 기존 콜이 유지됐다. 몇 개의 챌린지는 선수가 충분히 부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소위 깻잎 한 장의 차이로 ‘인’ ‘아웃‘이 판가름 났다. 눈에 보이지 않을 그 찰라를 심판들의 눈은 정확히 맞춰냈다. 관중들의 "오~~~"하는 감탄사는 그 예리함에 대한 보너스였다.
숫자가 말해준다. 선수와 심판의 챌린지 싸움에서 7대 1로 심판들의 완승, 심판들의 집중력과 정확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풀세트 접전, 타이브레이크 혈투, 홈 관중의 거센 함성.
국가대항전 특유의 압박감 속에서도 체어 엄파이어와 라인 심판들은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판정은 빠르고 단호했고, 경기는 매끄럽게 흘렀다.
이번 매치의 심판진은 국제 심판 위주로 구성됐다. 큰 무대 경험이 축적된 인물들이 중심을 잡으며, 경기의 권위를 세웠다. 전자 시스템이 보조하더라도, 최종적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과 판단이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승부를 벌였다면, 심판들은 그 승부의 신뢰를 지켜냈다.
부산 데이비스컵, 또 하나의 주인공은 분명 심판들이었다. “굿”이라는 한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인상적인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