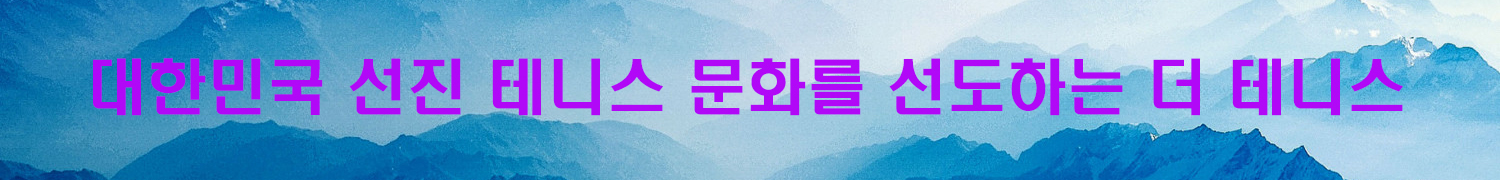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가벼웠다.
멜버른의 아침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바람이 불어주니 코트를 오가는 발걸음이 한결 수월했다. 오전 11시, “오늘은 세 경기 다 본다”는 마음으로 첫 코트에 들어섰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루가 끝날 무렵 몸은 완전히 굳어버렸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첫 경기는 엘리나 스비톨리나와 코코 고프. 이름값만 보면 팽팽한 승부를 기대했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흐름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코코 고프의 샷은 유독 길거나 네트에 걸렸고, 에러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반면 스비톨리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차분히 쌓아가며 “이건 오늘 내 경기야”라는 듯 경기를 정리했다. 관중석에서 딸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테니스는 역시 실수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잠깐의 이동, 물 한 모금.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경기.
제시카 페굴라와 미라 안드레예바의 맞대결은 첫 경기와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다. 화려함보다는 끈질김의 싸움. 페굴라는 랠리가 길어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몇 번이고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이 정도면 끝나겠지” 싶은 순간에도 페굴라는 다시 한 번 공을 넘겼다. 결국 점수판에 찍힌 것은 2-0. 테니스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다.
세 번째 경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로렌조 무세티와 노박 조코비치.
무세티는 첫 포인트부터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감각적인 백핸드, 각이 살아 있는 드롭샷. ‘와’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2세트까지 흐름은 완전히 무세티 쪽. “이거 3-0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말이 관중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테니스는 언제나 예측을 비껴간다.
3세트, 무세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표정이 굳었고, 결국 메디컬 타임아웃. 잠시 후 내려진 결정은 기권. 코트 위에 남은 것은 조코비치와 묘한 정적뿐이었다. 환호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흘렀다. 그렇게 조코비치는 4강에 올랐다. 오늘만큼은 ‘행운의 조코비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코트를 빠져나오며 문득 생각했다.
윔블던은 여러 번 와봤지만, 호주는 처음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 났다. 추운 겨울이 유난히 싫어서 “언젠가 겨울엔 호주로 도망오자”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마침 딸과 일정이 딱 맞아 이렇게 호주오픈까지 오게 됐다.
호주오픈은 윔블던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 좌석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관중의 표정도 더 밝다. 여름 대회라서일까. 테니스가 축제처럼 느껴진다. 딸과 나란히 앉아 경기를 보고, 중간중간 웃고 떠드는 이 시간이 괜히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제 남은 일정은 금요일 준결승, 그리고 일요일 결승. 그 두 경기를 끝으로 우리는 다음 주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일 아침, 딸과 함께 멜버른의 거리를 천천히 달려볼 생각이다. 테니스 코트가 아닌 곳에서도, 이 여행의 리듬을 몸에 조금 더 새겨두기 위해서.
멜버른의 여름 한복판에서,
딸과 함께한 첫 호주오픈은 그렇게 천천히, 깊게 기억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글·사진= 호주 멜버른 조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