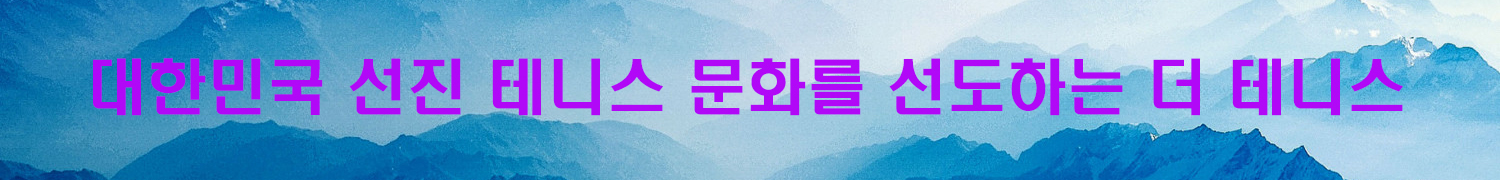상하이 2일차, 모이는 시간은 8시다. 늘상 울리는 7시의 알람은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초등학생처럼 10분만…10분만을 속으로 외쳤다. 단 10분의 잠이 내게 더 필요한 순간이었다. 어제 밤…기사 쓰고, 사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 시간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은 8시 15분전…나에게 씻고 짐 싸서 나가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남은 시간은 5분, 아침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면서 잠시 고민해본다. 아직 일행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다 됐는데 참는게 맞겠지“라고 속으로 결정한 찰라, 레슨 프로이자 우리 더 테니스 투어 팀의 여행사인 “(주) 위드 여행친구”의 김성우 대표 부부가 식당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을테니 빨리 들어가서 간단하게라도 들고 오세요”라고 말한다. 김성우 대표의 아내 우주영 프로는 실업선수 출신으로 두 부부가 동호인 레슨을 하고 있다
“그럴까? 그럼 부탁햐~ 후다닥 계란 후라이 몇 개 먹고 나올테니~”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였다.
라운지 들어서자 마자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려 놓고 계란 후라이 3장만 집어들고 앉을 자리를 찾는데, 먼저 룸에서 나가신 나의 룸메이트 형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 목포에서 올라오신 나의 룸메이트(이영진) 형님은 65년생으로 42년의 구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가 있었다. 시니어 배우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씨가 출연했는데 그 프로에서 백일섭 씨는 ‘무조건 직진‘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룸메이트 이영진 형님이 딱 그 캐릭터와 닮았다.
스스로 밝힌 닉네임은 ‘지존무상’, 우리가 지어준 별명은 테니스에 진심인 ‘독고다이’ ‘My way’다.
“난 절대 지지 않아. 실력이 떨어져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게임 들어가면 실력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게임하지. 무조건 승리를 위해 직진이야.”
나와는 정 반대다. 난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패와 별반 상관없는 게임을 한다. 나보다 실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실력이 떨어져서 지고, 나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봐주다가 지는 스타일…그게 바로 나다.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겐 최악의 파트너인 셈이다.
“강력한 포핸드와 백핸드 슬라이스를 겸비했고, 상대편의 타이밍을 빼앗는 빠른 서브가 나의 장점이지”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 일행이 나선 길의 운은 좋았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차도 사람도 많지 않았다.
‘예원‘…6천평 규모의 중국 전통 정원으로 명나라 중기에 만들어졌다. 상하이의 대표 관광명소로 바로 옆에는 유명한 전통 상가거리 예원상성이 이어진다.
1시간여 눈과 귀로 예원을 담은 후 한식집에서 이른 점심을 한 후 치중 경기장을 향해 출발했다. 경기장 정문 1km 남짓 남긴 채 차량 정체가 잠시 있었으나 오랜 시간은 아니었다.
눈에 익은 경기장, 과거 6년 전에는 정문 입구에서 두 가지의 정체가 있었다. 차량 정체와 함께 암표를 들고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암표꾼 정체였다. 흥정만 잘하면 정상가에 비해 어떤 건 반 가격에도 살 수 있었고, 그들과 흥정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를 가미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도대체 그들은 이 표들을 어떻게 한 묶음씩 들고 있을까? 어떤 이가 들려준 바에 의하면 ‘지위가 높은 공산당워’들을 통해서 흘러 나온다고 하는데…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은 티켓을 모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현장 발권은 하지 않는다. 우리 표도 여권 번호랑 모두 기입해야만 구입할 수 있었고, e-티켓으로 받았다.
정문에 다달으니 관중들 모두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카메라로 얼굴을 찍고 있었다. 이른바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시스템으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이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중국의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모두 이 AI 안면인식 기반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나도 줄을 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 시키고 게이트를 지나 경기장으로 들어섰다. 6년만의 치중 경기장 입성이다. 일단 기자 AD 카드를 받아야 했다. 기자들이 있는 미디어센터를 찾아 20여분을 헤맨 끝에 드디어 입성, AD 카드를 목에 걸었다.
“이게 얼마만이냐? ‘감개무량’이다”
이번 상하이 마스터즈에는 ‘포토그래퍼’로 신청했다. 물론 과거에도 늘상 ‘포토그래퍼’ 즉 사진기자로 AD카드를 받았었다. 내가 렌즈에 담는 선수들의 사진은 보도 목적이 아니다. 선수들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사진이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샷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셔터를 누른다.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셔터음이 나였다. 내 카메라는 1초에 12장이 찍힌다.
포토그래퍼는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진을 담는다. ‘헉헉 거리는 호흡에서부터 이글거리는 눈 빛’까지 선수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내겐 더 없이 고마운 자리다.
짐을 풀고 카메라를 들고 센터 코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들어갔다. 랭킹 16위 체코의 지리 레헤츠카와 54위 프랑스의 아르뜨르 랭드르크네의 2세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승리는 랭킹은 훨씬 낮고 나이는 7살 많은 랭드르크네가 가져갔다. 랭드르크네를 보니 지금은 은퇴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가 생각났다.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 패한 레헤츠카는 2세트 타이브레이크 5-6 매치 포인트에서 서브 앤 발리 공격을 시행하다가 에러하며 패하자 라켓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1세트도 한 게임 브레이크 당한 후 그 한 게임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주고, 2세트도 타이브레이크에서 한 포인트 에러하면서 졌으니 화딱지가 날 듯도 하지”